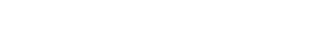라이센스뉴스 = 정재혁 기자 |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 역할을 그간 충실히 담당해 왔다. 가입자 수가 39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이란 수식어도 붙는다.
재정 형편상 모든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민영보험사들이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부와 합심해 내놓은 것이 바로 실손보험이다.
이러한 실손보험이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높은 손해율로 인한 적자가 수 십년째 쌓이고 쌓여, 이제는 상품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2조 5000억원의 적자를 봤고, 올해는 적자 규모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낸 자료에서 내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실손보험에서만 약 112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판매를 지속하려면 손해율을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보험연구원은 2031년 이후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내년부터 매년 보험료를 19.3%씩 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당국에 ‘보험료 20%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퇴짜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과 비슷한 10% 초반의 인상률을 검토 중이다.
“(실손보험료의) 인상폭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정 원장의 주장은 원론적인 면에선 타당하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실손보험의 상태가 원론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속이 곪아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도 이 점을 모르지 않지만, ‘표심’에 민감함 정치권의 등쌀에 보험료 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엔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여야 모두 물가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치인 입장에선 당장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었다”며 선전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것을 업계는 물론 금융당국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
생명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판매 회사가 줄면 남은 회사들이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이는 더 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자 폭이 커져 모든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포기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제2의 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의 판매가 중단되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물론, 현 실손보험의 상태는 단순히 보험료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구조 개선과 일부 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 조직적인 보험사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보험료 인상은 고사 위기인 실손보험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정치권 눈치만 볼 게 아니라, 국민복지의 연속성 차원에서 충분한 보험료 인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기사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을 원한다면 해당 국가 국기 이모티콘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This news is available in English, Japanese, Chinese and Korean.
For translation please click on the national flag emoticon.